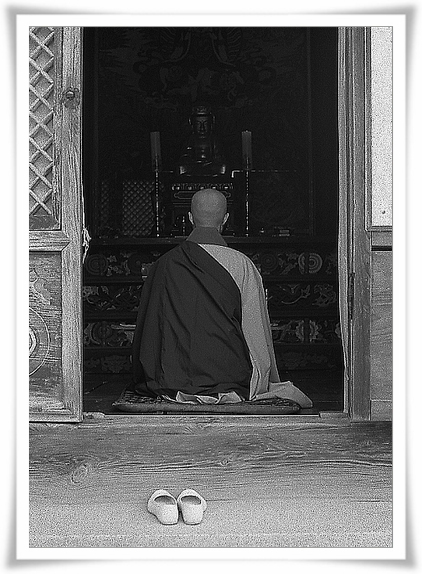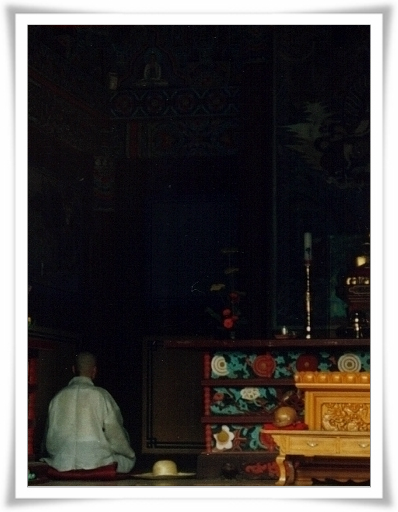운문사는 560년(신라 진흥왕 21)에 신승(神僧)이 창건한 절로 608년(진평왕 30)에는 원광법사가 이곳에 머물면서 크게 중창했다고 한다. 고려시대인 937년(태조 20) 중국 당(唐)나라에서 법을 전수받고 돌아온 보양국사(寶壤國師)가 이 절을 짓고 작갑사(鵲岬寺)라 했으나, 943년 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이 보양국사가 절을 세웠다는 말을 듣고 많은 전답과 함께 '운문선사'(雲門禪寺)라고 사액한 뒤부터 운문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. 현재 이 절에는 조계종 운문승가대학이 설치되어 많은 비구니들의 교육과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,. 경내에는 우리나라 사찰 중 가장 규모가 큰 만세루(萬歲樓)를 비롯하여 대웅보전(보물 제835호)·미륵전·작압전(鵲鴨殿)·금당·강당·관음전·명부전·오백나한전 등 조선시대의 많은 건물들이 남아 있다. 중요문화재로는 금당앞석등(보물 제193호)·동호(보물 제208호)·원응국사비(보물 제316호)·석조여래좌상(보물 제317호)·사천왕석주(보물 제318호)·3층석탑(보물 제678호) 등이 있다.
|
| |
|
운문사 금당 앞에 놓여 있는 8각 석등으로, 불을 밝혀두는 화사석(火舍石)을 중심으로, 아래에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받침을 두고 위로는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었다. | |
대웅보전(보물 제835호)
우리나라 사찰중 가장 규모가 큰 만세루(유형문화재 제424호)는 법회나 설법을 하는 장소이다.
원응국사비(보물 제316호)는 고려시대 중기의 승려 원응국사(1051∼1144)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, 원응국사는 일찍 출가하여 송나라에 가서 화엄의 뜻을 전하고 천태교관(天台敎觀)을 배워 귀국하였다. 1109년 선사(禪師)가 되었고, 인종 22년(1144) 운문사에서 93세로 입적하였다.
비는 비받침, 비몸, 머릿돌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, 받침돌과 머릿돌이 없어진 상태이다. 다만 세 쪽으로 잘린 비몸만 복원되어 있다. 비의 앞면에는 그의 행적이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. 만들어진 연대는 비가 깨어져 알 수 없으나, 국사가 입적한 다음해에 인종이 국사로 명하고, 윤언이에게 글을 짓게 하였다는 비문의 내용으로 보아 대략 1145년 이후로 짐작된다.
|
|
석조여래좌상(보물 제317호)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석불로 운문사 작압전(鵲鴨殿)에 사천왕석주와 같이 모셔져 있다. 높이 0.63m의 고려시대 석조여래좌상으로, 광배(光背)와 대좌(臺座)를 모두 갖추고 있는 완전한 형태의 불상이지만, 호분이 두껍게 칠해져 세부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. 이 불상은 겉옷 안에 표현된 속옷, 전반적으로 투박해진 표현기법 등에서 9세기 불상을 계승한 10세기 초의 불상으로 보인다.